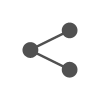코로나19로 경제가 마비 상태에 이른 요즘, 게임 산업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게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다. 그중에서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의 활약은 특기할 만하다. 전작이 출시된 지 7년 만에 닌텐도가 야심 차게 선보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3월 한 달 동안 500만 장이 판매돼 콘솔 게임 월간 판매량 최고치를 경신했다. 3월 20일 출시 이후 불과 열흘 동안 거둔 고무적인 성과다.
‘동물의 숲’의 인기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2001년 처음으로 출시된 ‘동물의 숲’ 시리즈는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3,400만 장가량의 판매량을 올리며 닌텐도의 효자 상품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애당초 다수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는 RPG로 기획됐던 동물의 숲은 닌텐도 64의 메모리 제한으로 인해 샌드박스 형태의 게임으로 탈바꿈했다. 경쟁 요소도, 엔딩도 없는 이상하고 설익은 게임이 초판 물량 완판을 넘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닌텐도의 간판 프랜차이즈가 될 것이라고는 개발진조차 예상치 못했다.
<동물의 숲>이 성공을 거두자 귀여운 캐릭터와 스트레스 해소를 내세운 유사 타이틀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유사 콘텐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숲>이 굳건히 왕좌를 지키고 있는 저변에는 유저 간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시스템이 있다. 게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특산물 과일과 꽃은 유저 프로필을 생성하자마자 무작위로 정해진다. 게임 내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특정 가구의 색상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배정받지 못한 아이템을 얻고 싶다면 다른 유저와 통신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유저가 홀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제한하는 것은 모바일 게임이 과금을 유도할 때 흔히 쓰는 꼼수지만, <동물의 숲> 제작진은 특산품 시스템을 이용해 유저 개개인의 섬에 특색을 부여하는 동시에 유저 간 교류를 이끌어냈다.
‘무트코인’이라 불리곤 하는 시스템 역시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끌어 내는 데 일조한다. 매주 일요일 구매할 수 있는 무는 일주일 내내 가격이 변동한다. 일주일이 지나면 무가 썩어버려 가치가 사라지기에 뭇값이 오를 때까지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저마다 뭇값의 등락 여부는 상이하다. 온라인상에서는 높은 뭇값을 인증하며 자신의 섬을 개방하고 다른 유저를 초대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동물의 숲’이 활발한 커뮤니티를 자랑하는 데에는 무트코인의 공이 크다.
피시방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MMORPG 게임에서도 유저 간 소통이 이뤄지지만, ‘동물의 숲’에서 이뤄지는 소통은 더 포근하고 편안하다. 타인에게 민폐를 끼칠 걱정이 없는 탓이다. 한 번의 조작 실수로 팀이 밤새 기울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다른 게임과 달리, ‘동물의 숲’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무례는 다른 사람의 꽃을 밟는 것 정도다. 유저 간 소통이 세대나 숙련도와 무관하게 모든 이용자가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된 것은 아이템 제한과 무 시스템, 그리고 게임 본연의 특성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우리 사회에서 게임은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가족 간의 소통을 멎게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사회적 편견에 대한 훌륭한 반례다. 게임을 처음 개발한 에구치 카츠야는 타지로 이사할 때 느꼈던 외로움에 영감을 받아 게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처음 맞는 재난 속에서 단절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 열풍을 통해 잘 만든 게임은 우리를 흩어놓은 것이 아닌 ‘모이게’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를 바란다.
*샌드박스 게임: 별다른 규칙이나 목적 없이 유저가 자유로이 게임 속 세상을 탐험하도록 하는 게임
장윤서 기자
yunseo05@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