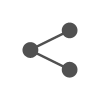지난 10월 강원도에 영리병원 설립 허가 법률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결정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영리병원이 한국 공공의료 시스템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의료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간주하고 진료비를 고정하는 수가 제도와 전 국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한다. 현행법상 국내 병원 설립 주체는 ▲의료인 ▲정부 ▲지자체로 한정돼있으나 영리병원은 ‘영리법인’이 설립 주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수가 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예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의료 불균형이라는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영리병원이 고수익 의료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 의대 교수 힘멜스타인은 내한 강연에서 “영리병원은 돈이 되는 특정 진료 영역에 고급기술로 무장해 집중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미국 내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무려 19% 높다”며 의료의 질적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이 의료 불균형을 보완할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도 영리병원을 성급히 도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OECD 회원국 평균 공공병원 비율이 55.2%인데 반해 한국은 고작 5.4%다. 아시아의 의료 허브라 불리는 싱가포르에서는 고차원의 진료가 필요할수록 공공병원의 비율을 최대80%까지 구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영리병원 도입에는 공공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단지 병원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성급하고 부실하게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민영화의 이득은 결국 기업에만 돌아가고 의료 접근성은 현저히 악화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영리병원의 도입이 필요한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 및 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수로 수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