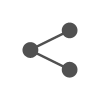본교에서는 학과·학부마다 전공과목에서 영어 강의(이하 영강)를 일정 개수 이상 수강할 것을 졸업요구조건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서 3~8개의 영강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하지만 영어에 미숙한 교수자가 영강 수업을 전담하거나 특정 전공과목이 영강으로만 개설돼 전공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낮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계획상으로만 영강일 뿐 한국어로 수업하는 사례도 있어 영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낳는다. 이에 The HOANS에서 본교의 영강 운영 실태와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다.
본교는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갖춘 리더 양성을 위한 국제화 전략으로 영강 비중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특히 영강 비중 증가는 국제화 지표를 평가점수로 반영하는 QS 대학평가로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전공과목 영강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약 28%에서 작년 30.9%, 올해 1학기 31.3%로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전공 영강 개설과 관련해서는 단과대학이나 학과·학부의 내부 지침을 따른다. 전공과목 중 영강이 약 67%를 차지하는 경영학과의 경우 AACSB나 EQUIS 등 국제인증에 맞게 일정 비율 이상 영강을 개설하는 기준이 있다고 밝혔다. 정경대도 40%라는 영강 비율 기준에 맞게 매 학기 약 43% 정도의 영강 전공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영강 비중과 영강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담당하는 교수자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다. 이에 영어에 미숙한 교수진이 영강 수업을 담당해 학생들이 과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잦다. 이번 학기에 영강을 수강하는 A 씨는 “교수자가 전공지식을 서툴게 영어로 설명하다 보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문 강의(이하 국강)로 진행하는 다른 분반 친구와 진도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미숙한 영어로 내용이 전달됨에 따라 외국인 학생에게도 영강서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외국인 유학생 B(경제 20) 씨는 영어를 더듬으며 설명하는 경우 이해가 어려우며 “그렇지 않더라도 영강과 국강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외국인 학생에게도 영강이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임이 드러난다.
한편 과목이 영강으로만 개설되거나, 영강인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례도 있었다. 작년 공과대학의 경우 1학년이 수강하는 영강인 전공관련교양이 시간표에 정해져 국강을 선택할 수 없이 강의를 수강해야 했다. C(건사환 20) 씨는 “영강과 국강 중에 최소한 선택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유로움 없이 영강을 수강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의가 영강으로 개설됐음에도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했다는 제보도 이어진다. 지난 학기 영강으로 개설된 전공과목을 수강한 D(경제 19) 씨는 “유학생도 몇몇 있었지만 설명은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학생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그 의미를 흐리게 하는 혼란스러운 영강 운영을 두고 여러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학의 국제화 전략을 위해 개설된 영강의 수만 늘리기보다 질 높은 수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곽덕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화가 불가피한 흐름이라면 교수가 국내 학생들과 유학생들이 모두 영어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강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교 측은 대외적인 대학평가만을 고려하기보다 다양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신중히 영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본교가 내실 있는 영강 운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보일지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김동현 기자
justlemon22@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