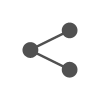17년 성황리에 종영한 드라마 ‘비밀의 숲’은 올해 속편으로 돌아왔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지며 방영 당시에 보지 못했던 비밀의 숲 1편을 볼 수 있었다. 1편은 그 명성처럼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명작이었다.
1편이 종영한 지 3년이 더 된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은 이창준이 실질적인 주인공이었다고 회고한다. 평검사에서 시작해 검사장을 거쳐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자리에까지 도달한 이창준은 드라마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범죄를 계획했다. 그는 검찰에게 뒷돈을 대던 스폰서 박무성과 박무성의 소개로 고위층과 불법적인 만남을 가진 여고생 김가영을 살인할 것을 교사한다. 많은 이들이 이창준에게 ‘다크나이트’라는 칭호를 붙이며 그를 찬양했다. 그러나 드라마의 주인공인 황시목 검사는 이창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다른 관점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이창준이 사회가 낳은 ‘괴물’이자 죄인을 단죄할 권리가 본인 손에 있다고 착각한 살인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영웅 이창준의 모습 이면에 숨겨진 범죄자 이창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창준은 부패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으며,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박무성과 김가영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회의 악에 속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과연 이창준에게 두 사람을 살인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가족을 잃은 박무성과 김가영의 친족이 정의 구현을 위해 두 사람이 희생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었을지 역시 의문이었다. 결국 이창준의 논리는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가 자기합리화를 위해 내세운 명분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목 아래 활동해왔다. 본교의 한 학우 A 씨는 디지털 교도소에 의해 성범죄자로 지목돼 본인의 신상이 밝혀진 후 사망했다. A 씨는 해명글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제시했지만 소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운영자는 법망을 피해 가는 범죄자를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마녀사냥식 사적 제재에 불과했다. A 씨의 죽음 이전에는 근거 자료의 충분한 수집 없이 무고한 사람의 신상을 게시해 피해자 본인과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도 있었다.
우리는 각자가 확립한 정의에 대한 관념을 토대로 살아간다. 그러나 본인만의 정의를 명분 삼아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형벌을 가할 때, 법이 형성한 이성적 질서는 무너진다. 그 빈 자리를 채우는 건 감정과 증오뿐이다. 이창준도,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도 자신의 행위는 사회가 실현하지 못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정의라는 탈을 쓴 괴물의 횡포에 불과했다. 국민의 법감정보다 낮은 형량을 받아가는 범죄자들을 보며 우리는 법망이 너무도 허술한 것은 아닌지 생각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시민이 각자의 법감정을 토대로 죄인을 단죄하려 난립할 때, 수많은 이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법치주의의 근간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황시목은 검찰이 지금보다 공정하고 정직해져 이창준과 같은 괴물이 탄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시급한 임무는 법치주의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 법원과 검찰이 또 다른 괴물의 탄생을 방조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 아닐까? 법치주의가 제 역할을 다해 무고한 이가 피해를 보지 않는 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