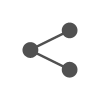“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지고 싶다.”
언제부터인지 짊어진 짐들이 너무 많아 무거울 때면 이렇게 나지막이 중얼거리곤 한다.
우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이 나와 보니 우물이었다. 아니, 어쩌면 우물 안의 존재였음을 애써 부정했을지도 모른다. 우물에서 나와 마주한 세상은 햇빛으로 밝게 빛났지만, 햇볕은 과연 따사롭지 못하고 따가웠다. 다시 우물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지도, 점이 되어 사라지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 지도 어언 1년째에 접어들었다.
누군가 대학이라고 적어 놓은 결승선만 보고 달리던 고등학생에게는 대학이 만병통치약이 돼 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당장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일도 없었다. 그래도 대학에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생길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빠져나온 우물 밖의 세상에는 비상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그것도 가까운 곳에 존재했다. 그나마 좋아하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꿈으로 삼고 이에 맞춰 진학했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와 함께 꿈은 증발해버려 ‘좋아하는’ 것은 더는 흥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애매한 것으로 남게 됐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겠다며 좋아하지도 않는 분야에 뛰어들어 실력을 길러보고자 한 선택은 패기 넘치던 날들에 대한 후회와 온몸을 짓누르는 부담감을 가져왔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점이 되어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정처 없이 방황하던 어느 새벽, 중앙광장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그대로 고개를 들어 쳐다본 밤하늘에는 작지만 밝은 초승달이 걸려있었다. 그 옆에는 별이 하나 숨어있었다. 하나밖에 보이지 않던 별은 점점 많아졌고 온 하늘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별들로 가득해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 모순적이게도, 그 순간 나는 점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점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이 좋다고 생각했다. 점이 되면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없을 테니 말이다.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고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한다. 대학 입시 외에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어 행복했던 그때가 그립다. 돌아가면 버티지 못할 것 같은 빽빽한 시간표마저 그립다. 하지만 동시에, 친구를 앉혀놓고 대학 입시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던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며 고단함을 토로하던 그때의 나를 기억한다. 고등학생의 내가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했듯, 시간이 흘러 20대가 된 나는 순수하면서도 치열하게 살던 10대를 회상하며 그리워한다. 아마 30대가 되면 처음 사회에 나와 미숙한 모습 가득하던 20대를 그리워할 것이다.
인간은 종종 과거의 기억을 미화시키곤 한다. 때로는 반성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해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반복하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고생 끝에 이루어낸 무언가가 있을 때, 그 고생한 기억들이 미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하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다. 아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 기제인 것 같다.
당장은 괴롭기 그지없는 순간들이 자꾸만 닥쳐올 것이다. 마주한 현실이 감당하기 버거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나저러나 미화를 통해 행복한 기억으로 남게 될 순간들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고통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마감과 동시에 약 한 달 동안의 작성 과정에서 겪은 모든 괴로웠던 기억을 미화시킬 나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다. 그리하여 오늘부터는 짐을 조금 내려놓으려고 한다. 지나가는 모든 과정을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맞이해보고자 한다.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