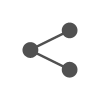끝없는 역풍과 함께한 한 해였다. 어느 공동체가 그렇지 않겠냐마는 본교의 일상도 잠시 멈췄다. 휑한 학교는 코로나19 대응에 온 신경을 쏟기 바빴고, 내로라하는 행사가 취소되며 학생사회는 어느 때보다 침체했다. 원체 제한된 공간에서 기삿감을 찾아온 보도부에게도 올해는 그 범주가 너무나 좁게 느껴졌다. 위기 가운데 어떤 기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깊어져만 갔다. 매 순간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묻고, 또 물으며 일 년이 흘러갔다.
어느덧 종착지에 다다라 걸어온 길을 돌아보건대, 해답은 ‘공리’에 있었다. 기사는 공리 증진을 위한 실천이며 기자는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고자 펜을 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런 신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곧 기자의 위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즉, 사회적으로 기자에게 용인되는 혜택이 곧 기자가 의무를 갖는 이유다. 이를 이해하고 나니 어떻게 해야 공리를 극대화하는 기사를 쓰는지에 대한 답은 자연스레 뒤따라왔다.
기자는 일반 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정보를 여럿 구할 수 있다. 물론 소명을 요구하는 학생의 말을 학교에서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학생으로서 괜스레 낯 붉힐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자라는 명함을 내밀고선 알 권리를 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자는 취재를 거쳐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덧붙이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흩어진 정보를 모았을 뿐인 기사는 독자들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것 이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더 나아가 기자 스스로 정보를 생산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럴 것 같긴 하다’는 문제 인식을 ‘그렇다’, 때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입증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코로나19 여파로 안암동 상권의 유동인구가 줄었을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명확한 주장이라고 보기 힘들다. 일일 지하철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월별 평균을 구하고, 이를 예년의 데이터와 비교할 때 그 주장은 강력히 뒷받침된다.
때로는 기자라는 위치가 참 편해 보일 때도 있다. 보이는 결과의 장단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는 쉽지만, 막상 대표자의 자리에선 그들도 분명히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기자의 역할 중 ‘조망’을 ‘방관’으로 오해한 것이다. 세상에 완벽한 방안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문제점을 나열하는 식의 기사는 곤란하다. 이런 가운데 기자가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보다 공리를 키울 수 있는 대안을 살펴 제시하는 것이다. 다른 학교의 사례를 끌어오거나, 나름의 개선책을 고안해 기사에 담아내야 한다.
공들인 기사가 많이 읽힌다면 좋겠지만 설사 아무도 읽지 않는다고 해도 상심할 필요는 없다. 취재 과정에서 마주한 공동체원들의 자성(自省)을 기대해봄 직하기 때문이다. 기자는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회의의 속기록을 낱낱이 읽어보고, 원자료를 확인해 제시된 자료를 검증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래야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레 누군가는 당신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이것을 인지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더욱 건설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기자로서 그간의 노고와 현장에서 느낀 점을 어떻게 전부 적어내냐만 공리에 대한 일종의 사명이 나에게는 좋은 기사를 쓰는 원동력이었음을 전하고 싶었다. 펜을 들어 한 획을 그으면 써지는 것은 선뿐이 아니다. 그 주위로 잉크가 번진다.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수반하는 책임감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 획에 잉크가 번지고, 또 번져나가는. 그런 기사를 쓰길 바란다.
조수현 기자
shcho712@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