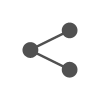4학기의 기자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 The HOANS 기자로서 쓰는 마지막 글인지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생각이 많았다. 고민 끝에 The HOANS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인 ‘질문하기’를 다루기로 했다. 누군가 The HOANS 활동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익숙했던 나는 이제 질문하는 것이 예전만큼 어렵지는 않다.
그동안 다양한 사건·사고를 취재하면서 목표는 좋은 기사 쓰기 하나였다. 인터뷰를 마칠 때 인터뷰이에게 들었던 그 말 “좋은 기사 써주세요”에 부끄럽지 않은 기사를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에서부터 질문이 생겨났다. 좋은 기사란 어떤 기사일까? 어떤 기사를 좋다고 말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문득 ‘왜’를 찾아 달려가는 기사가 좋은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는 기자가 아니라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에 다가설 수 있다. 혹은 기자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정보도 있다. 이 점을 활용하면 기자는 정말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The HOANS 활동은 질문을 던지고 그것과 씨름하는 시간이었다.
기자는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을 하고, 또 그래야 하는 존재다. 어떤 정책이 성공했다면 ‘왜’ 잘 됐을까를 파고들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따진다. 비정상적인 징후를 감지하고 ‘왜’라고 묻는다면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다. 당연해 보이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왜 이렇지?’ 질문해 보는 것으로부터 취재는 시작됐다. 그러다가도 ‘이 일이 과연 기사로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에 맞닥뜨리기도 했다. 어찌저찌 취재하기로 한 후에도 많은 고민과 질문이 뒤따랐다.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할까. 인터뷰이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중립성과 방향성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할까. 취재와 기사 작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물음표의 향연’이었다.
나는 아직도 취재하면서 품었던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다. 우선 충분한 공부와 고심 속에서 좋은 질문이 나오고,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끌어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질문과 답을 담은 기사를 누군가 읽는다면 그 사람은 또 나름의 질문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 모든 일은 항상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 기자가 날카롭고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 고심해야 하는 이유다. 기사에 담긴 글자 하나하나의 끝에서 변화의 불씨는 피어난다.
또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달았다. 나의 중심을 잡으면서 각양각색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기존의 자료를 참고하든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든 해야 나 자신에게 떳떳한 질문, 기사에 담기에 괜찮은 질문을 떠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기사를 돌아보건대 늘 좋은 질문을 안지는 못했던 듯하다. 마감에 쫓겨 쓴 기사도 있고, 중요한 문제의식을 포함한다고 생각해 물고 늘어지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수정을 거듭해야 했던 기사도 있다. The HOANS를 떠나려니 뿌듯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이것 때문일 것이다.
예전이면 별 관심 없이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에 괜히 한 번씩 ‘왜’를 던지고, 그렇게 취재하며 기사를 쓴 지 2년이 됐다. 이 글을 끝으로 The HOANS라는 공동체에 몸담으면서 고민하고 질문하며 기록하는 일은 멈추지만, The HOANS 바깥에서 그 삶을 이어가려 한다. 이 글의 마침표를 찍기 전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 ‘지난 2년간 좋은 기사를 썼는가?’
정지윤 기자
alwayseloise@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