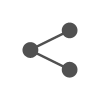이동권 보장, 장애인 관련 예산 증가를 주장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실시한 ‘장애인 지하철 시위’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는 직장인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운행을 막는 식으로 이뤄져 큰 반발을 낳았다. 진정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가 행정, 사법기관이 아닌 또 다른 ‘을’인 직장인의 출근길을 담보로 이러한 시위를 벌인다는 점이 주로 지적받았다.
지난 2월 시위 도중 지하철에 타고 있던 일반 승객이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다며 욕설을 내뱉자 해당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 중 하나가 “그러면 버스를 타세요”라고 답한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이에 대해 해당 장애인, 나아가 장애인 지하철 시위와 장애인 전체에 대한 거센 비방이 일었다. 이렇게 과격한 형태로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얻는 것이 아닌 ‘장애인은 이기적이고 피해 의식에 휩싸인 사람들’이라는 반감만 더할 뿐이라는 반응이었다.
시위가 본격적으로 화두에 오르기 전인 작년 장애인 시위에 관한 한 영상을 본 적 있다. 영상에는 전장연 정책국장이 등장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장애를 가졌으나 ‘장애를 덮고, 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비장애인처럼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유수한 외국계 기업에 인턴으로 입사했고, 명문대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장애인이 취약한 환경에 놓이고 속수무책으로 죽는 모습을 보며 장애인 인권 운동을 다짐했다. 그는 “착한 장애인은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지만 나쁜 장애인은 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며 장애인 시위가 ‘나쁜’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토했다. 이를 보고 영상 속 표현에 따르면 장애인이 ‘난리 난리 생난리’를 쳐야 겨우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논의되는 현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 시위가 비장애인의 출근길을 방해함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러한 방법으로까지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면의 이야기에 주목했으면 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곧 장애인 생존과 연결된 문제이며, 비장애인과 똑같이 이동상 편의를 누릴 수 권리가 있다. 장애인이 가진 몸 또는 정신의 불편함이 무언가를 행하는 데에 있어서 제약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은 몇 주 전 특수 교사인 어머니와 대화를 하며 더욱 확실해졌다. 어머니는 본인의 특수학급 이야기를 해주시며 “장애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제각기 특성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사람을 좋아하는 학생, 돈을 좋아하는 학생, 권력을 쥐길 좋아하는 학생 등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무언가를 선호하고 생각하며 욕망하는 주체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명제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은 데는 장애인을 오로지 장애인이라고만 범주화해 바라보고 그들을 ‘동정할 대상’ 내지로만 여겼던 필자 스스로 오만함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 중 88.1%가 후천적 장애인이다. 나, 내 곁의 친구들, 어쩌면 장애인 시위에 대해 불평하고 비방했던 이들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운이 좋아 그동안 장애인이 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동권에 대한 장애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장애인 그리고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용의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이 관용의 태도를 갖기를 강요하고자 이 글을 쓴 것은 아니다. 관용적인 개인은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의 형성에서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야 한다. 언제 약자가 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바를 누리지 못하고 매일 생존과 투쟁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사회가 함께 변화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민지 기자
ymj020110aa@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