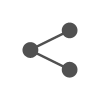개봉 이틀째에 <헌트>를 관람하고 왔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반응은 이렇다. “어땠어? 영화관 가서 볼만한 영화야, 그냥 넷플릭스에 들어왔을 때 보면 되는 영화야?”
영화표 값이 오르면서 ‘영화관에 직접 가서 볼만한 영화’의 의미가 바뀌었다. 스크린 몰입감이 있는, 화려한 사운드와 화면 크기로 관객을 사로잡는 영화는 여전히 극장에서 사랑받는다. 반면 완성도가 뛰어나더라도 투자 규모가 작아 덜 강렬한 영화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OTT 서비스를 통해 공개될 때 봐도 충분하다는 관람평부터 듣기 일쑤다. 좋은 영화보다는 스펙터클이 돋보이는 영화가 흥행할 기회를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름시름 앓아 온 영화산업에서 티켓 값 인상은 나름의 대책이었다. ‘한 칸 띄어 앉기’ 캠페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좌석이 절반이었고 그마저도 관객을 안심시키지 못해 텅텅 비었다. 2020년 CJ CGV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고 같은 해 10월 평일 기준 1만 원이던 티켓 값을 2천 원 인상했다. 이듬해는 “생존을 위해 불가피했다”면서 1천 원을 인상했고, 올 4월 한 번 더 인상하면서 영화 한 편 값을 1만 4천 원으로 올렸다.
과연 티켓 값 인상이 영화산업의 위기에 대처하기에 알맞은 수였을까? 배급과 상영을 맡는 기업 입장에서는 표만 팔면 상관없지만, 이 흐름은 관련 종사자들이 영화관이라는 개념 자체에 재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서 즐기는 OTT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객은 굳이 비싼 돈 주고 영화관을 찾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느낀다.
비싸진 비용만큼 안전하게 재미를 얻으려는 심리가 작용해 흥행 양극화 또한 심해졌다. 극장 내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때 몇몇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는 동시에 티켓 값이 부담스러워진 분위기 속 관객을 놓친 영화의 곡소리가 함께 울려 퍼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전체 관객 수의 1/4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영화로만 몰리니 작은 영화의 창작자들은 두 번씩 피를 보게 됐다.
관객이나 영화의 특정 장르에서 문제를 찾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높아진 티켓 값의 부담은 분명히 이미 흥행이 보증된 플롯을 사용한 영화와 ‘영화관에 직접 가서 볼 만큼’ 현란한 액션과 음향 효과를 집어넣은 영화로의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영화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의미 있는 영화가 극장에 걸리지도 만들어지지도 못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작품성보다 흥행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자리 잡힌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새로운 걸작이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흥행 법칙에 맞춰 찍어내듯 나오는 영화는 관객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겠지만, 그때 가서 남는 대안은 없을 것이다.
영화관은 필자에게 언제나 설렘을 전했다. 팝콘을 집어 먹으면서 곧 스크린에서 벌어질 사건을 기다리는 시간과 영화가 끝나고 수다 떨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그 영화에 대한 추억으로 녹아들고는 했다. 그 일상은 코로나19가 끝나면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온 영화관은 심심찮게 논란을 일으키는 한편 티켓 값까지 무리하게 올리면서 아쉬움만을 가득 안기고 있다. 극장 내 코로나19 규제가 전부 없어진 마당에 여전히 비상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고수해야만 하는지 애정 어린 의문이 든다.
혹자는 이제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입증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한다. 하지만 전자책의 선전에도 종이로 된 책이 버림받지 않듯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 역시 OTT 시대에서 든든한 취미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저 티켓 값의 인상이 다른 나쁜 상황과 맞물리는 바람에 더 이상 좋은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는 영화표 값이 그만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권예진 기자
yejingwon@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