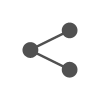국회가 또다시 ‘국회했다’라는 평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6일에서야 겨우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4년 전 선거구 무효화 사태까지 겪고 총선 42일 전에야 획정안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음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총선을 39일 앞두고 확정돼 가까스로 2004년의 ‘D-38’ 기록을 넘기지 않았다. 가뜩이나 어수선한 시국에 국회는 좌충우돌하며 국내 혼란만 가중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다. 그러나 이 기한은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여겨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시도별 의원정수와 인구 상하한선 논의를 겨우 시작했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지난달 2일 원내대표 회동서 획정위 안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획정위에서 사상 최초로 선거구 획정 기준부터 방안까지 독자적으로 결정해 제출한 획정안에 퇴짜를 놓은 것도 원내대표 회동이었다. 기한이 무색할 만큼 논의를 미루고 경쟁하더니, 공을 떠맡긴 획정위 안에 문제가 있자 한뜻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모습은 헛웃음을 유발했다.
선거구 획정은 모든 유권자가 관심 가져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유권자가 자신이 투표할 선거구조차 모른 채 획정 방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은 황당할 따름이다. 획정위 제출안에 문제시할 부분이 있었음은 사실이나 이 사태를 유발한 국회의 책임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는다.
이는 비단 이번 총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문제다. 총선 준비는 임기의 막을 내리며 국회의 쇄신을 기하는 과정이 아닌가. 지난 ‘동물 국회’를 반성하며 국회의 본분을 지키겠다고 한 발언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국회 내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유권자는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표를 행사하는 위치가 아니라 행태에 따라 표의 행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다음 국회의 새 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표심 잡기에 급급한 모습이 가당키나 한지 의문이다. 임기의 시작과 끝이 무탈하도록 국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