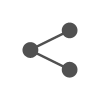“꿈이요? 없어요”
대학교, 학과, 꿈. 하나라도 빼먹으면 허전할 정도가 되어버린 질문 3종 세트, 그리고 그 중 유일하게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꿈을 묻는 말이 되겠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꿈을 대답하기까지 0.1초의 시간이 걸렸다면, 지금은 “없어요”라고 대답하기까지 0.01초의 시간이 걸린다. 암울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하는 청춘들의 증상이, 주로 대학교 2학년 때 발현한다는 ‘대2병’이 나에게도 찾아왔다.
이를 의식하기까지 반년이나 걸렸다. 이전까지는 왠지 모를 공허함을 설명하기 위해 다달이 온갖 이유를 붙여가며 합리화했다. 3월에는 잦은 술자리, 4월에는 시험 기간, 5월에는 미뤄놓은 약속들로 꽉 찬 일정, 6월에는 또다시 시험 기간. 쳇바퀴를 도는 듯 반복되는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어느새 종강이었다. 놀라울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흘렀지만, 지난 4개월을 돌이켜보면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없었다. 기억에 남을 만한 휴식은커녕 소소한 일탈도 없었다. “여행 가고 싶다”, “한강 가고 싶다”며 노래를 불렀지만 실천에 옮긴 적은 전무했다. 여행은 방학으로 미뤘으며 한강은 여유가 생길 언젠가로 무기한 미뤘다. 정말 말 그대로 ‘학교생활’에 집중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시험을 두 번 치고 나니 한 학기가 끝나 있었다. 종강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할 거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종강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했는가? 아니, 안타깝게도 실패했다. 막상 방학이 되자 휴식은 또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나는 어떻게든 아르바이트 따위의 생산적인 일을 찾으려고 했다. 수험생활의 여파로, 휴식은 생산적일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때는 작은 행복을 즐기던 내가 존재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지 않은 수업 시간에 몰래 빠져나와 분식집에 간 적이 있는가 하면, 학원을 빼고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탄 적도 있다. 수능을 한 달 앞둔 날씨 좋은 어느 날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밖에 나가 비눗방울 놀이를 한 적도 있다. 앉아서 공부만 하던 따분한 일상 속의 나는 금방이라도 기억에서 증발해버릴 듯 평범하기 짝이 없지만, 그 갑갑한 일상에서 벗어나 순간의 여유를 즐기며 행복해하던 나는 쉽게 잊히지 않더라.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거창하고 호화로운 휴식은 아닐지라도 소소한 일탈과 작은 행복이 시들어가는 삶에 한 줄기의 빛이 돼줄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순간의 휴식이 가장 생산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과연, 선배들은 현명했다. 중앙광장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잔뜩 취해보지 않으면 새내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선배는 생각보다 많았고, 수업이 너무 듣기 싫었던 나머지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으로 달아난 선배도 있었다. 거기에, 4년 내내 놀고 졸업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입실렌티와 고연전 소식이 들려오면 피가 끓는다는 선배이자 선생님의 말씀까지.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여타의 말처럼 한 귀로 듣고 흘렸던 그들의 새내기 시절의 이야기는 뒤늦게 떠올려보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
대학생이라면 시기를 불문하고 겪을 수 있는 것이 대2병이다. 하지만 대2병이라는 무거운 이름 안에 가둬놓기에는 찬란히 빛날 시간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20대, 바로 청춘이다. 하늘이 예쁜 어느 날 하루쯤, 친구들과 한강에서 노을 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를 통해 작은 행복을 누려보자. 수업을 빼면 어떻고, 계획하지 않은 일정이면 또 어떠한가. 가끔은 무계획이 곧 계획이라고 하지 않는가? 어쩌면 누군가는 “1학년이니까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거지”라며 혀를 찰 수도 있다. 하지만 속는 셈 치고 하루만이라도 쳇바퀴에서 내려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 쳇바퀴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
김민지 기자
minji1130@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