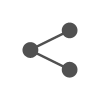누구에게나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이 있다. 단편적인 추억만이 머릿속에 맴돌 뿐인 시기. 간간이 가족들에게서 어린 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민망함과 함께 호기심이 올라왔다. 그때를 보고 싶었지만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앨범 속 사진 몇 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전부였다. 십 년도 더 묵은 디지털카메라를 복구할 수 없는 것이 항상 아쉬웠다.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 친구분의 카메라 메모리에서 내 어린 시절 영상이 수두룩하게 발견됐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앉은 자리에서 몇십 개가 넘는 영상들을 전부 봤다. 훌쩍 커버린 스물한 살의 내가 본 일곱 살의 나는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온 마음으로, 온전히, 너무나도 행복해했기 때문이다.
사춘기 이후로 나는 스스로를 과감히 던져본 적이 없었다. 늘상 밝긴 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구석이 있어 마음 한편에 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나 자신 말고는 누구에게도 나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다. 친한 친구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벽을 치기도 했다. 공연을 볼 때나 친구들과 노래방을 갈 때나 마음 놓고 즐기지 못한 채 늘 어딘가에 매여 있는 느낌이 들었다.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일시적인 감정에 몸을 맡기지 못했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하는 데에 서툴렀다. 그러자 언제부턴가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 틀을 씌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자연스레 믿게 됐다.
이런 내가 걱정 한 톨 없었을 것만 같은 어린 나의 모습과 행동을 보니 적잖이 당황했을 수밖에. 나는 음악에 맞춰 아버지와 함께 신나게 방송댄스를 추는, 만두를 빚다 남은 밀가루를 파우더 삼아 어머니께 발라드리며 화장놀이를 하는, 음이 엉망이지만 부끄러워 않고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 지나가던 여행객에게서 산 돗자리를 쓰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남이섬에서 무진장 뛰노는 말괄량이였다. 거의 모든 영상에서 나는 입꼬리와 눈꼬리가 맞닿을 만큼 활짝 웃고 있었다.
멍하니 영상을 보다가 순간 그때의 몸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그때의 마음으론 돌아갈 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아이처럼 온 마음으로 행복을 즐기고 싶었다. 다음날부터 곧장 매 순간 찾아오는 감정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주저 없이 해버렸다. 그때만큼 천진난만한 행동은 아닐지라도 나의 내면에 충실해지는 것은 예상보다 더 뜻깊은 일이었다. 주변 사람들도 내게 성격이 많이 유해졌다며, 한결 여유로워 보여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나의 내적인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마구 뛰노는 모습을 보면 함께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라틴어 명언 Carpe diem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을 때, 뜻하지 않게 마음에 드는 모자를 발견했을 때, 단골 빵집 앞을 지나며 고소한 버터 향을 만끽할 때처럼 사소한 모든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가끔은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순간의 감정에 나를 완전히 맡겨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 아닐까.
최혜지 기자
chj0418@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