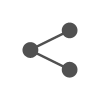지난달 16일 KAIST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한 졸업생이 입이 틀어 막힌 채 팔과 다리가 들려 졸업식장 밖으로 강제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는 자교 학위 수여식장에서 ‘R&D 예산 보강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했을 뿐이다. 대통령실 경호처의 야만적인 과잉 대응은 장안의 화제가 됐다.
이런 ‘입틀막’ 경호는 단발적이지 않았다. 지난 1월 18일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질질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고, 지난달 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역시 입장을 요구하다 경호원에게 입을 틀어 막혔다. 경호처는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했기에 조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장면은 심기 경호에만 급급한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일련의 사태가 더 개탄스럽게 다가오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사부터 ‘자유’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취임식 당일 ‘자유’는 총 35번 거론됐고, 이후로도 각종 행사 연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지난해 4월 27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란 제목하에 자유란 단어를 46번이나 사용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자유를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즉 남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남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것’은 이미 평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은 유리돼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는 어떠한 의미로 쓰였을까?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권 때 반공주의의 기치 아래 독재체제를 만들면서 이를 자유라고 분식(粉飾)했다. 반공주의를 자유라고 명명하며 자유와 평등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해괴한 담론구조를 만들었다. 평등은 사회주의적이고 자유는 민주주의적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자유에 특권적 가치를 부여했다. 자유진영·자유세계·자유대한·자유당 등이 그 예이다. 반면 평등을 불온한 세계관으로 몰아가며 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지상 가치라 세뇌했다.
평등이 없는 자유는 강한 자의 무절제한 횡포, 귀족주의로 이어진다. 자유가 없는 평등은 모두가 노예가 되는 전체주의가 된다. 포퍼는 열린사회와 닫힌사회를 구별하고, 자유 사회의 개념을 열린사회라고 정의한 후, 그 열린사회를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사회라고 봤다. 그가 말하는 자유란 개인이 자기 이성을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자유이며, 권리란 지배자를 비판할 권리를 의미한다. 닫힌사회는 전체주의적 특징을 가지므로 개인의 자유가 전체의 이름으로 제한되고, 권력에 대한 비판은 금기로 여겨지는 사회다.
우리 사회가 열린사회인지 논의하는 것은 제쳐두고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실질적으로 무엇인지에 천착해 본다면 그의 과거 발언에서 대강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자유 ▲가난한 사람은 최저 임금 이하로도 일할 수 있는 자유 ▲가난한 사람은 120시간 일할 자유.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밝혀온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주가 조작할 자유 ▲부동산 투기할 자유 ▲해고를 자유롭게 할 자유 ▲통정매매를 할 자유 나아가 ▲권력이 국민의 공공 재산을 사유화할 자유로 이어진다.
지배자를 비판할 권리를 배척하고 평등을 적대시하는 자유는 결국 가진 자의 무절제한 횡포를 옹호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유 역시 주체가 존재한다. 자유를 향유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모두인가? ‘대통령’ 본인뿐인가?
오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