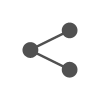‘내가 생각하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증거를 손에 쥐고 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의 곁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 세상의 한 인간은 다른 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발명해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라 이 생각을 믿는다.’ 한겨레 칼럼 칸의 ‘신형철의 격주시화(隔週詩話)’ 한 편에 실린 구절이다. 인터넷을 떠다니다 발견한 이 짧은 단락에 나는 금방 마음을 빼앗겼다.
‘다른 한 인간을 향한 사랑’의 실천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시작부터 함께해 왔다. 문명의 첫 증거를 넓적다리뼈가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으로 보는 인류학자도 있다. 큰 골절을 당하고도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로 어떤 이가 다쳐 곤경에 처했던 그 옛날 또 다른 이가 그를 위험으로부터 구해주고 치유될 때까지 곁에 있어 줬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인간을 돕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행위를 생존 전략으로 삼은 건 행운이었다. 치사하게 물어서, 인간애(人間愛)로부터 비롯된 문명의 이기에 혜택을 입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 마나 한 훈계다. 다만 서로 잘 사랑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영 망설이게 된다. 요즘 세상에는 마치 사랑받기에 적합한 인간의 틀이 정해져 있는 듯하다. 과거에 사랑받은 인간들이 우월성이라는 착각 속에 신분과 인종에서 예외가 없었다면, 현재는 ‘얼마나 사회에 어울리기 적합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기준 삼아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에 점수를 매기고 있다.
성소수자는 한평생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수용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된다. 한참 요식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노키즈 존’ 논쟁도 현실을 투명하게 비춘다. 어린이가 그들만의 특성을 가졌고 그 다름을 인정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타이틀로 우리에게 익숙해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또한 같은 흐름이다. 비정규직 산업재해 사고와 턱없이 적은 급여 문제는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되나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 건 없다.
어떤 이들은 당장 보기에 이해할 수 없고 거북한 모습을 가지기도 한다. 남보다 낮은 성취를 해내거나 더 많은 도움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는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를 긍정하는 관점에서 도태돼야 할 개체로 보일는지 모른다. 출발점부터 달랐다는 사실은 정당한 차별의 근거가 되고, 이미 배려했는데도 무엇을 더 달라는 행위는 민폐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회적 기준에 매끄럽게 들어맞는 인간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다. 왜 사람들은 갈수록 운에 의해 얻어낸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절대적인 우위로 여기고, 그렇지 못한 타인은 깎아내려야 한다고 느낄까? 보석을 세공한 듯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인물만 용인해 주는 방향으로 세상이 변해 간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꼭 정체성에 갇히지 않더라도 빽빽해진 사회적 잣대와 경쟁, 획일화에 대한 부담에 염증을 느끼는 모두가 이 무한 압박 사회의 희생자다. 이제부터는 모든 이로부터 잠재력을 발견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싶다. 낙오자를 골라내고 논외로 치워버리는 성급함은 우리 사회를 망가뜨려 그 잠재적 발전 가능성과 공동체적 신뢰를 돌이킬 수 없게 할 것이다. 공감과 책임감을 잃어가는 지금의 추세는 서로 돌보고 공동체를 꾸려 살아간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던 생존 전략과는 반대로 가는 꼴이다.
이유가 뭐가 됐든 민폐 끼치는 당신에게 이 글을 바치며 맺으려 한다. 매일 하루와 싸우면서도 한편으로 자기 자신을 의심하느라 고생이 많다. 당신을 향한 사랑을 발명해낼 거라는 허세를 떠는 대신 한 마디만 더 전하겠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 지금 그대로.
권예진 기자
yejingwon@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