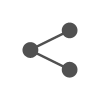지난달 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였다. 당시 재수생이었던 나는 국가의 무능으로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를 추모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다. 고맙게도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차원에서 이를 추모할 일이 생겨 많은 학우와 기억을 공유했다. 하지만 펄럭이는 깃발들 사이로 대학이 많이 보이지 않아 섭섭하기도 했다. 시대가 그러려니 싶다가도 이런 참사 앞에서 연대하지 못하는 사회가 애석하게 생각됐다.
이런 슬픔을 분노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사실이 사무치도록 뼈아픈 날이었다. 추모대회가 ‘정치집회’라는 이유로 불참하면서 3일 전에는 박정희 前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했다. 굳이 무엇이 더 정치적인지 따질 필요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서글펐던 것은 학생사회의 빈자리다. 책임지지 않는 태도로 발생한 억울한 죽음마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모습에 그날 밤은 더 시렸다.
흔히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한다. 상아탑은 현실과 유리된 장소를 가리키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대학에서만큼은 학생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렇듯 대학은 존재를 수긍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율성의 이상이 추구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IMF 이후 대학은 시장의 흐름에 편승했다. 진리를 탐구하는 대신 기업이 기대하는 연구를 내놓으며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했다. 대학이 변하면서 학생 역시 수험 준비와 스펙 쌓기 등 혹독한 처지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됐다. 드넓은 하늘 아래 진리와 희망을 논하기는커녕 세속적 이해관계와 천박한 상업문화에 순응하고 얕은 인간관계에서 외로움을 간간이 해소하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런 혼자 살아남기 급급한 상황 속에서 청년이 연민을 갖기 어렵다. 연민은 보통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생긴다고 한다. 먼저 타인이 고통이 그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닥친 비극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 비극이 언제든 나를 엄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어도 연민의 감정이 무르익지 않은 이유는 사회가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문하기에 그리고 이런 존중의 문화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으로 번졌기 때문도 있다.
연민조차 결핍된 사회에서 ‘연대’는 생각하기 어렵다. 타인의 고통이 대부분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그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착각해 버린다. 사회의 밑바탕이 사람이고 사람의 뿌리가 청년 시절에 자라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황폐한 현실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의 비극이다. 아무리 건물을 높이 세우더라도 꿈과 이상이 좌절되고 청년들이 아픈 사회는 실패한 사회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청년 시절이 그렇듯 대학이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미래 가치를 경작하는 시간이다. 대학은 한 사회의 미래를 이끌 사람을 기르는 요람이다. 대학 나아가 학생사회는 정치권력과 자본 그리고 ‘오늘’로부터 독립돼 사회에서 청년의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늘’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활동이 ‘정치적’이고 불가해하게 느껴진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가장 멀다는 말이 있다. 머리가 좋은 사람과 마음이 좋은 사람의 거리가 멀고, 머리로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진실로 마음 아픈 사람이 되기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요소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의 틀을 깨뜨려야 한다. 대학의 위기를 외부에 탓을 돌리기 전 내부에서 변화가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제 발로 걸어가야 한다. 꿈보다 깸이 먼저여야 한다. 자유와 인권의 역사, 진보의 역사는 언제나 탈문맥(脫文脈)의 도정(搗精)이었기 때문이다.
오정태 기자
jeong3006@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