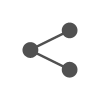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줄이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현실을 높인다. 둘째, 이상을 낮춘다. 필자는 그동안 전자만이 옳은 방법이라고 믿었다. 이상을 끊임없이 좇으며 노력하는 삶은 그 자체로 빛나기 때문이다. 마치 운동선수가 넘어지고 다쳐도 결승선까지 이 악물고 향하는 모습처럼 이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은 필자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이기도 했다. 뭐든 잘 해내는 멀티플레이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 목표 앞에 주저앉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이상 낮추기’, 즉 타협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뒤돌아 곱씹어 보니 참 오만한 생각이었다. 타협도 나름의 가치가 있으며 우리는 잘 타협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타협의 미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당장 시험공부가 그렇다. 필자는 시험 기간마다 완벽주의로 인한 중압감에 짓눌렸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모든 것을 챙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모자랐다. 모든 내용을 똑같은 힘으로 공부하기는 – 적어도 필자에게는 – 불가능했다. 그래서 ‘자신과의 타협’을 시작했다. 욕심을 버리고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고민했다. 배운 내용을 쭉 적어 내려가며 무엇이 출제될 법한지 따져 보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건 과감하게 버리는 과정. 지켜야 할 것과 아쉽지만 버려야 할 것을 분류한다. ‘나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는 모 수험서 회사의 슬로건을 비웃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깨달았다.
타협 없이 완전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삶이 가능하겠는가. 시간의 한계가 숨통을 조여 오고, 눈앞에 보이는 능력의 한계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녕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 주어진 선택지 중 가장 나은 선지는 최선을 다한 타협뿐이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질문이 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부서지더라도,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끝까지 지켜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차원에도 적용되는 문제다. 어떠한 정책적 결정에는 반드시 선택이 포함되며 그 선택은 비용을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절대 저버려선 안 될 가치는 무엇이냐고.
올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몇 가지를 되돌아본다. 치열한 고민을 거듭하는 정의로운 타협이 이루어졌는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켜냈는가? 사회적 약자를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먼저 놓아버리진 않았는가? 주 69시간 근로제는 노동자의 휴식 시간을 포기하고 생산성 향상을 잡고자 했다. 타협하는 과정에서 ‘쉼’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버려도 되는 것으로 분류됐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흘려보내는 대신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꾀했다. 피해자들의 의사는 그렇게 타협의 대상이 됐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고 했다. 그 말을 잠깐 빌리겠다.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야, 바보야!’ 타협 그 자체엔 죄가 없다. 모든 것을 챙기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세심하게 고민한 끝에 나온 타협의 결과를 마냥 비판할 수만은 없다. 문제는 처음부터 다 포기할 작정으로 무기력하고 비생산적인 논의 끝에 나온 타협이다. 사회에서 놓쳐선 안 될 가치를 저버린 타협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필자 본인과 이 글을 읽는 당신과 우리 사회에 묻는다. ‘치열하게 타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하진 않았습니까?’
정지윤 기자
alwayseloise@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