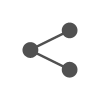세상은 왜 이리도 가혹한가.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데다 혹여나 잘못된 선택이 스노우볼이 돼 나를 짓누를지도 모른단 생각에 현실이 참 무겁게 느껴지곤 한다. 당장만 해도 그렇다. 본지 이번 호를 기점으로 편집국장을 내려놓을 사람으로서 담담하게 ‘허심탄회’를 쓰겠다고 했건만 도무지 무엇을 쓸지 정하지 못하겠다. 담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도 한데다 딱딱한 기사만 쓰다가 내 이야기를 하려니 마치 발가벗은 기분이 드는 탓이다. 보름을 고민하고서야 마감을 목전에 두고 키보드를 두드려 본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써야겠다. ‘닥치는 대로 하자’는 게 내 인생 신조인지라.
어릴 때 틈만 나면 부모님과 두 동생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했다. 해남 땅끝마을부터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아마 안 가본 곳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다. 고등학생이 돼 더 이상 여행을 자주 다닐 수 없게 됐을 때쯤, 그간 여행지에서 보고 느끼고 만났던 모든 것이 내 자신감의 밑천이자 양분이라는 걸 느꼈다. 어떤 경험 하나도 헛되지 않았으며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생각이 점차 뚜렷해졌다. 뭐든 닥치는 대로 하며 일단 겪어보자는 신념도 이로부터 비롯됐다.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공부했고 대학에 입학했다. 성인이 되고선 돈을 모으고 싶었기에 무작정 파스타 가게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첫 아르바이트라 실수가 잦았고 웃지 못할 일도 많았지만 꿋꿋이 출근 도장을 찍었다. 불현듯 서빙 실수로 테이블에 파스타를 살짝 쏟았던 일화가 떠오른다. 손님께 거듭 사과를 했는데 돌아오는 손님의 반응이 의외였기 때문이다. “어, 아가씨 나랑 같은 신발이네? 신발 보는 눈이 있어.”라며 내가 민망하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건네던 분. 2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누군가 내게 어떤 어른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그분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아르바이트를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과외를 통해 돈을 좇으면서는 돈이 참 부질없음을 느꼈다. 과외를 위해 방문하는 아파트가 본가 아파트의 5배 가격이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됐기 때문이다. 본가의 아파트가 더 넓고 훨씬 최신의 것이었는데 단지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집값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내가 좇는 게 과연 돈인지 무엇인지 생각하며 미래를 그려보는 미래를 그려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
또한 닥치는 대로 사랑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1,400일가량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는 오랜 연애의 비법을 묻곤 한다. 그러나 비법이랄 건 없다. 그냥 매 순간 아낌없이 표현했고 함께 하는 순간을 최대한 즐길 뿐이다. 닥치는 대로 사랑해 본 대상이 남자친구만은 아니다. 이스포츠에 푹 빠졌던 작년 말에는 단순 경기 관람을 넘어 직접 이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스포츠라는 공통 관심사 하나만으로 모인 다양한 사람-띠동갑 아저씨, 이스포츠 선수 출신, 유튜버, 직장인-을 만나 소통하며 전인적으로 많은 배움을 얻었다. 이스포츠를 더욱 잘 즐기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선배를 따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온 정경대학 신문사였지만 매월 본지를 발행하는 활동은 수많은 고뇌와 선택의 연속이었다. 첫 편집국장으로 취임했던 작년 9월을 떠올려 보면 글자 하나, 표현 하나 고치기도 참 어려워했다. 편집국장이 뭐라고 이래도 되나 싶었다. 그렇다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봤자 검토해야 할 기사만 한가득 밀릴 뿐이었다. 일단 고민은 잠시 미뤄두고 당장 검토할 수 있는 기사부터 닥치는 대로 읽고 또 읽었다. 어차피 해야 할 고민이라면 나중에 해도 된다는 생각이었다. 어찌어찌 매 월호를 발행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요령도 생겼다.
본사의 기자로 남기는 마지막 글이기에 훨씬 우아한 글을 쓰고 싶었건만 사적인 이야기만 주절거린 듯하다. 훗날 이 글을 다시 보면 분명 아쉬움이 남을 듯하나 당장 마감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후회는 나중의 몫으로 미루고, 이 투박한 글을 핑계 삼아 두고두고 본지를 떠올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다.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보단 어떻게 소화하고 배우느냐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내게 5학기 동안의 본지 발행은 추억인 동시에 경험이었고 정말 많이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 지난 5학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이 그랬다. 남은 기자들과 새로운 출발을 맞은 기자들, 그리고 하찮은 이 글을 읽을 독자 모두가 앞으로 저마다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선택과 고민을 마주할 것임을 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그 고민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는 일단 아무렇게나 해보는 게 어떨까. 거침없이 나아가고 겸허히 받아들이자, 닥치는 대로.
정채빈 기자
jcbid1020@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