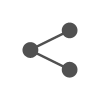“파란 약을 먹으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 자넨 잠에서 깨어 일상으로 되돌아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며 살면 돼. 빨간 약을 먹으면, 이상한 나라에 남는다. 나는 토끼굴이 과연 어디까지 깊은지 보여줄 걸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큰 인기를 끌어온 시리즈 영화 〈매트릭스〉의 유명한 대사다. 까만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주인공에게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을 내밀며 무엇을 선택할지 묻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영화 속의 인간들은 평생을 매트릭스라는 가상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인간이 맞이하는 진실은 컴퓨터에 의해 주입된 꿈일 뿐이지만, 인간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위 대사에서 주인공은 파란 약을 먹고 매트릭스에 남아 편안한 거짓 안에 안주하며 살지, 빨간 약을 먹고 매트릭스를 탈출해 진실을 위한 힘겨운 전쟁을 할지 선택해야 했다.
이 유명한 클리셰를 곱씹다 보면 주인공이 해야 했던 선택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외면하겠는가, 마주하겠는가. 필자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늘 이런 선택과 대면해왔다.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즐겁게 여가를 보내다가도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이 있다. 고등학교 2학년의 마지막 시험을 치르던 날,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얼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등학교 3학년, 대입을 위해 자기소개서에 매달리고 있을 때 그 대학교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올해 8월, 처음으로 맞은 방학을 실컷 즐기고 있을 때 ‘제2의 N번방’ 사건이 터졌다. 늘 믿고 싶지 않았다. 일상이라는 울타리 안은 개인의 미시적인 일들로 정신없이 굴러가는데 밖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었다. 부조리의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어 마주하기도 전에 무기력함에 잠식당하곤 했다.
영화 속에서는 비참한 진실에 대한 도피 수단이 파란 알약을 먹는 행동이다. 우리 사회의 파란 약은 혐오인 모양이었다. 혐오는 때때로 끔찍한 현실을 미화해주는 좋은 수단이다.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못사는 나라에서 왔는데 이걸로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꼭 나왔다. 청소노동자의 권리 투쟁에는 ‘대학생인 나도 최저임금 받는데 청소노동자가 더 받으려 한다’는 블루칼라 비하가 등장했다. 혐오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그런 처지가 될 만하다’는 마음 편한 합리화를 가능케 하고, 정의에 대한 담론을 불편한 이야기로 치부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죄책감을 쉽게 없애준다. 말 그대로 삼키기만 하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살 수 있는 ‘파란 약’과 같다.
필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편리한 합리화 수단을 목격하고 ‘빨간 약’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침묵과 혐오로 편안해진 개개인이 모인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회 내 한 집단의 억압은 합리화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바쁜 일상이라는 울타리도 영원히 안전하지 않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은 울타리를 틈입해오고, 그 무대는 언제든 우리의 집, 학교, 회사가 되어 또다시 타인에 의해 합리화될 수 있다. 잠식당하기 전에 현실을 마주하고 싶었다.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해도 말이다.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을 선택한 주인공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컴퓨터라는 강력한 상대와의 긴 싸움과 마주한다. 필자가 마주한 현실도 마찬가지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이슈에 하나하나 분노하다 보면 이런다고 바뀌나 싶어 무기력해지기 일쑤다. 그럴 때마다 부조리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외면하고 합리화한들 그 부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불편한 현실을 마주할 때의 무기력함은 당연하다. 중요한 건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맞서는 용기다. 현실과의 타협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김채현 기자
omoidz@korea.ac.kr